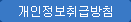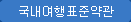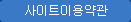제목 : 밤기차 소리에 마음은 설레고...
이름: 이서
작성일: 2005-05-27
조회: 3,909
토요일 밤의 서울역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리며, 나 역시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 특유의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합실을 둘러보았다. 머리를 맞대고 기차표를 들여다보는 학생들, 유행 지난 "머리카락 끊어먹기"를 하면서 대체 뭐가 그리도 재미난지 쉴새없이 깔깔대는 연인들, 큰 가방을 들고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는 아저씨,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도를 펼쳐 읽는 외국인.... 대합실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목적지를 그리며 남은 기차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시간은 벌써 10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다 비울 때쯤 친구가 도착했다. 녀석은 자기 덩치만한 테크노 백을 매고 있어, 흡사 "닌자 거북이"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내 앞에 서자마자 녀석은 늦었다는 인사도 없이 지레 물어왔다. "혹시.....나, 닌자 거북이 같아 보여"?
밤기차는, 철들고는 처음 타보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침대칸"이라는 것도 타본 적 있었는데.... 아직도 침대칸이라는 것이 운행되나 궁금하던 차에 안내방송이 나왔다. 침대칸은 우리가 탄 무궁화호에 예전과 다름없이 마련되어 있었다. 침대를 차지하는 추가 비용을 적잖이 내야 하지만, 피곤한 비지니스맨이나 노약자를 위해서는 아주 유용한 특별칸이라 할 만했다.
이번 밤차의 목적지는 전라남도 여수였다. 토요일 10시 50분에 출발해 하룻밤 단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다음날 새벽 5시 10분에 여수에 내릴 수 있었다.
국토 남단, 남해 바다에서 보는 일출은 정말 장관일 터였다. "흠~ 빨리 자자. 여섯 시간이니 잠은 충분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수원역도 채 못 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원효 대사가 향일암으로 간 까닭은...
여수에 도착하니, 벌써 봄기운이 느껴졌다.
바람 한 점 없이 부드럽고 깨끗한 공기가 얼굴에 늘어 붙어 있는 잠 기운을 털어 주었다.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 향일암이 있는 돌산읍으로 향했다. (돌산읍은 여수에서 일곱 번째로 큰 섬으로 홍합과 굴, 전어로 유명한 곳이다.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굴 구이가 제격이고, 돌산 갓김치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라고, 아침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 아줌마가 말씀해 주셨다. 역시, 그날 아침에 먹은 갓김치는 아삭아삭하면서도 시원하고 쌉쌀한 맛이, 금방 지은 이밥과 아주 잘 어울렸다. 휴일이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우리는 여수에서 밤을 보내며 굴 구이에 소주 한 잔을 곁들였을 텐데, 그것이 못내 아쉬웠다.)
돌산읍으로 가는 길은 돌산대교가 이어주고 있었는데, 한강에 놓인 다리와는 그 느낌이 달랐다.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아담한 다리였지만 파도치는 바다 위에 서 있어서인지 위풍도 당당해 보였고, 특히 다리 위에 설치된 간접 조명이 특별한 정취를 더해주었다. 아직 희뿌연 여명의 기운조차 없는 캄캄한 새벽에 하늘로 쏘아 올리는 불빛을 보고 있자니, "여수"라는 발음과 이 도시의 풍광이 늘씬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향일암은 선덕여왕 13년에 원효 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창건 당시에는 원통암으로 불리다가 고려 때는 금오암, 숙종 때 이르러 향일암으로 개칭된 절이었다. 임진왜란 때는 승려군의 근거지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이곳에 가려면 108번뇌보다 많은 수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계단을 반쯤 올라서면, 거기에 일주문이 서 있고,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가야 비로소 향일암의 대웅전을 마주할 수 있다. (같이 간 "닌자 거북이"는 관절이 약한데다 체력까지 보잘 것 없어, 향일암을 오르는 내내 심장을 붙들고 괴로워했다. 나는 닌자 때문에 행여 일출 시간을 놓칠까 내심 걱정이 되었다.)
향일암은 전국 4대 관음 기도처 중 하나로 전국에서 기도하러 오는 인파가 끊이지 않는 곳이란다. 아마도 원효 대사가 수도 도량을 한 곳이라는 유서 깊은 내력과, 남해의 수평선이 내려다보이는 기막힌 지리적 위치가 기도와 수행을 정진하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리라.
이곳에 올라 내려다보니 역시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의 이름과 걸맞게 온통 하늘과 바다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향일암은 금오산 자락의 기암 괴석이 거북의 등 형상을 하고 있어(그래서 영구암(靈龜庵)으로 불리기도 한다), 거북이를 신성시하는 우리 풍습과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향일암이 서 있는 정상을 거북이의 등이라 생각하고, 바다로 향해 둥글게 뻗어나간 뭍을 거북이의 머리로 보면, 이 기암 절벽의 산은 그 자체로 바다로 향하는 거북 형상이 된다. 이런 자연 앞에서라면, 욕구와 미망으로 가득 찬 욕망을 빌러 산을 올라온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기도를 먼저 올리게 될 것 같았다.
원효 대사의 기도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파르고 좁은 기암 절벽 사이를 통과하여, 꼬불꼬불 이어진 길을 좀더 올라가야 한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빠듯한 절벽 사이를 따라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 품었던 세속적인 욕심 따위를 하나씩 벗어버려 마침내 기도처에 다다랐을 때는 스스로 가벼워진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이 절벽 산 높은 곳에 암자를 지은 원효 대사의 마음을 천분의 일쯤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해의 특별한 해돋이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로 솟아오르는 태양을 결국엔 보지 못했다. 닌자 거북이의 느린 걸음 때문이 아니라, 날씨가 너무 흐렸던 것이다. 동틀 때의 붉은 기운만 조금 맛보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크게 실망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기암 괴석과 그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남해의 장관에 들떠, 사실 일출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번 굴 구이를 먹으러 와서 일출에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다도해로 유명한 여수 앞바다를 유람하기 위해 여객 터미널로 향했다.
바다를 구경하러 간다고 하자, 물 만난 닌자 거북이는 뛸 듯이 기뻐했다.